《난징! 난징!》은 중일전쟁 당시 난징에서 일어난 전투와 대학살을 다룬 흑백영화이다. 본 영화는 하나의 주인공이 아닌 복수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1937년 난징을 보여주는 군상극(Ensemble cast)이며, 당시 시대상으로 발생한 여러 고통을 보여주는 인간극이다. 이번호 컬처노트에서는 《난징! 난징!》을 통해 중일전쟁 난징 전선 속으로 들어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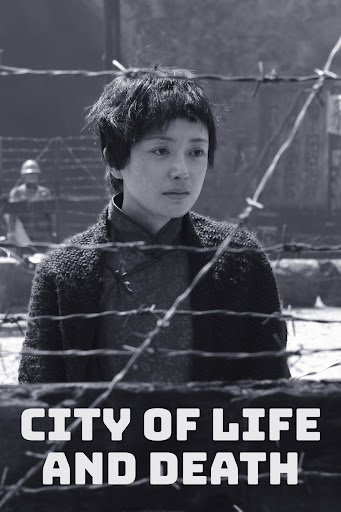
◇ 가해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난징전투
《난징! 난징!》의 루 추안 감독은 중일전쟁의 참사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담고자 하였다. 그래서였을까? 이 중국 영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그들을 침공한 일본인의 얼굴이다. 일본제국군 상등병 카도카와 마사오는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쨍쨍한 하늘을 쳐다본다. 중국군은 이미 전의를 잃고 도망갔기에, 그와 분대원들은 별다른 저항없이 난징 시가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도심 깊숙이 들어간 그들을 마주한 것은 교회 안에 모여있던 수백, 수천 명의 중국인이었다. 이때부터 카도카와는 죽어간다. 매복한 적인 줄 알고 쏜 여성과 아이들, 실제 매복에 당한 동료들, 위안부들, 그리고 대량 학살터에서 무덤덤하게 쓰러져가는 수많은 인간들까지 전쟁은 역설적으로 어느 가해자에게도 참혹한 것이었다. 죽어가는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쌓여가는 공훈과 계급이 아닌 위안소의 일본인 창부 유리코였다.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카도카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일본군의 학대에 그녀 역시 죽자 카도카와도 마지막 한 마디를 울며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다.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보다 힘들어”
◇ 삶과 죽음의 도시 : 난징
지금까지 가해자의 삶을 보았다면, 이제 난징 시민들의 삶을 살펴보자. 장쑤원은 탕과 함께 난징에 안전지대를 설립한 지식인 계층이다. 침략이 시작되고 그녀의 눈에 보이는 건 많은 민간인, 특히 아이들이었다. 안전지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녀의 의지는 시체가 인산인해로 쌓인 대량 학살터를 바라보며 더욱 커진다. 난징의 여성들이 빈번히 희롱당하자, 장쑤원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등 처절히 노력하였지만 마치 일본군의 장난으로 안전지대 깃발이 부러지듯이 그녀의 노력은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웠다. 최악의 상황은 안전지대의 수장인 독일인 욘 라베가 본국소환을 당하고 찾아왔는데, 안전지대는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도 포로 한 명을 구하다가 들켜 그녀 역시 위안소로 끌려간다. 그녀는 끌려가던 중 카도카와 마사오 군조에게 죽음을 맞았다.
또 다른 시민, 탕톈샹은 안전지대장 욘 라베의 비서이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 이따금 밖에선 끔찍한 비명이 들려온다. 곧 난징의 여성들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본 탕톈샹은 아내와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렸다. 그도 장쑤원과 함께 안전지대를 수호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독일인 욘 라베가 귀국한다는 소식에 결국 안전지대를 배신한다. 가정을 위해 중국군 잔졸이 안전지대에 숨어있다고 이른 것이다. 하지만 배신이 무색하게도 돌아오는 건 가정의 파괴와 재미 삼아 창문 밖에 던져진 딸의 죽음이었다. 아내와 여동생은 위안소로 잡혀가고, 그의 여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욘 라베가 떠나는 당일, 그와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었다. 탕톈샹은 아내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포로 한 명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다. 누구나 언젠간 죽는다며 그를 동정하던 일본군 장교에게 “내 아내는 다시 임신했다네”라는 말을 남기고 탕톈샹은 사살당한다. ▲카도카와 ▲장쑤원 ▲탕톈샹 이 세 인물의 삶은, 영화의 표제 ‘삶과 죽음의 도시, 난징’이 말해주듯이, 죽음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가? - 평화와 일상의 가치
우리의 뇌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희석한다. 류인균 전 서울대 교수(현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장)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외측 전전두엽이 나쁜 기억에 대한 반응과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심리적 외상 치료에 기여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람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집단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석된다.
물론 픽션인 이 영화가 실제 역사의 희석된 기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48년 11월 4일 극동 국제 재판에서 밝혀진, 난징 대학살 때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는 숫자는 “한 명의 죽음은 비극, 다수의 죽음은 통계”라고 독일 소설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 고통이다. 나는 이 영화의 장면 중 일본군의 승리 기념 축제를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 승리에 도취한 집단은 규율과 의식 속에 개인을 속박시키고, 중국인 포로들은 철조망 너머에서 이를 지켜보고, 그 가운데에서 카도카와 마사오는 정신을 반쯤 놓고 춤을 추며 절규하는 장면이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러한 승리를 위한 크고 작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난징! 난징!》이 만들어진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쁘고 자랑스러운 기억보다 뼈아프고 서러운 기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무도 당연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여유가 그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