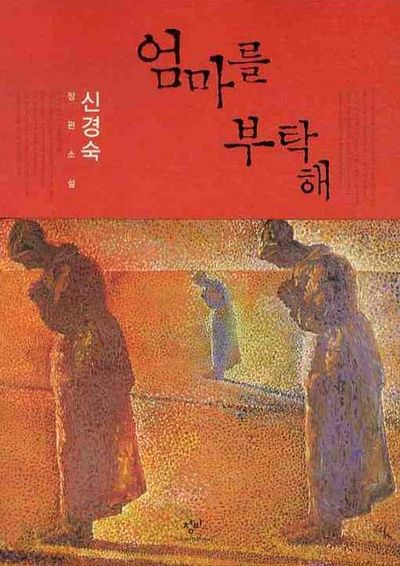
2008년 발표된 신경숙 작가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뇌졸중으로 치매를 겪던 엄마가 자식을 보러 서울에 왔다가 실종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마다 큰딸, 큰아들, 남편, 그리고 엄마의 관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엄마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서술한다. 이 책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다소 뻔한 주제일 수 있지만 절대 뻔하지 않은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의 자식인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 엄마를 잃고 나서야, 엄마를 잊었음을 깨닫다
이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첫 시작이라고 하기엔 무겁고, 다소 충격적인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엄마를 잃어버린 게 일주일밖에 안 되었을까?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엄마 본인은 글자도 모르지만, 큰딸만큼은 자신과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어 패물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켰다. 하지만 큰딸은 자기 일에 관해 묻는 엄마에게 ‘알아서 뭐 하게’라며 무시하듯 말했다. 엄마의 최고 자랑거리인 큰아들, 엄마는 큰아들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큰아들은 엄마가 이상하다는 전화에도 뇌졸중이었던 엄마를 외면했다. 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전단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엄마 생년월일조차도 제대로 몰랐다. 엄마를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일주일이지, 그들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책에 대해 ‘용서를 통한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미 엄마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작중 큰아들이나 큰딸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큰아들이나 큰딸처럼 엄마를 잃은 후에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지 모른다.
◇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 리스트
“그(큰아들)의 엄마는 한겨울인데도 파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엄마는 숙직실 문 앞에 슬리퍼를 벗어놓고 들어와, 늦지나 않았는지 모르겄다!며 그 앞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내밀었다.” 이런 못난 아들, 딸이어도 엄마는 큰아들이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편지에 난생처음 기차를 타고,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듯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급하게 전해주러 온 것이다.
우리 아빠는 요즘도 전화하면 ‘뭐 필요한 거 없어? 춥진 않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말한다. 20살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아빠는 걱정이 되는 듯하다. 엄마, 아빠라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을까. 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싶지는 않았을까. 너무 당연해서 몰랐지만 태어날 때도, 첫걸음을 떼던 순간에도, 20살이 되던 때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주는 사랑은 우리가 외딴곳에 떨어져도 버틸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었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품을 내어주었다.
‘엄마는 움직일 만해지자 너(큰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너는 엄마에게 오늘은 자고 갈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때 엄마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
깨질 것 같은 두통에도 엄마는 큰딸이 자고 간다는 한마디에 미소를 지었다. 사랑받은 만큼 다시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부모님은 그저 이 정도면 된다. 밝은 미소, 다정한 말투,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정도면 충분하다. 그동안 낯 간지러워 못했던 고마움, 그리고 사랑을 이 책을 핑계로 부모님께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