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엽의 단편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SF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 이전에 과학도였던 김초엽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우주 여행자, 우주여행, 딥프리징, 워프' 등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독자가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 같기도 하고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초엽은 이러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세계를 그리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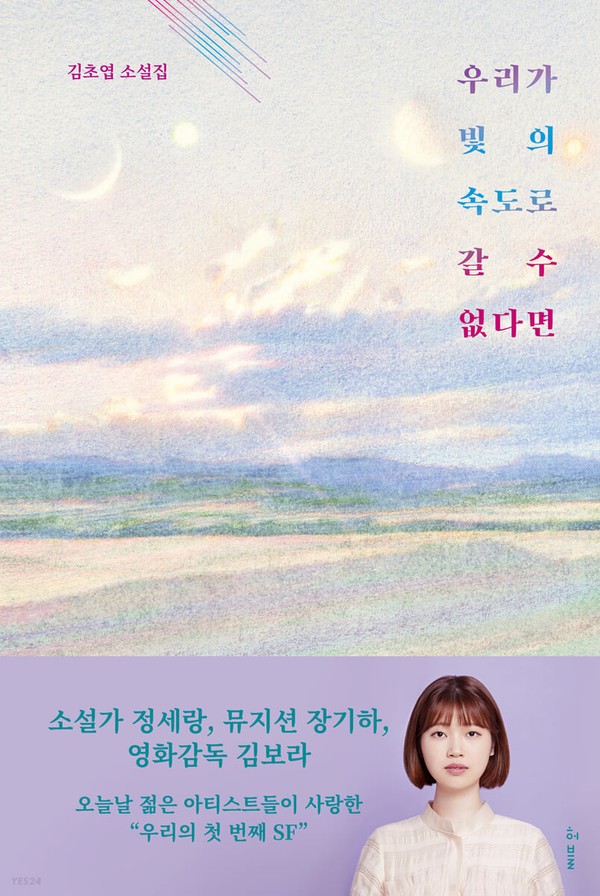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안나'라는 노인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안나'는 우주 개척 시대의 1차 혁명 당시 과학자로서 우주 항해를 하기 위한 워프 항법에 쓰이는 '딥프리징'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딥프리징'은 사람을 냉동시켜 긴 우주 항해 시간 동안 신체를 늙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안나가 '딥프리징' 연구를 마쳐 갈 때쯤 안나의 가족들은 '워프 항법'을 통해 슬렌포니아라는 제3의 행성으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안나는 이 연구를 마친 후 함께 하기로 결정한다. 안나의 '딥프리징'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었을 시점, 우주 개척 시대의 2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고차원 웜홀 통로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고 1차 혁명 기술이었던 '워프 항법'을 통해 이주하던 슬렌포니아행 우주선은 안나 팀의 연구 콘퍼런스 당일에 마지막 출항을 한다. 결국 안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슬렌포니아행 마지막 우주선이 떠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우주 정거장'에서 100년 넘게 자신이 만든 기술로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도착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낡은 우주선을 타고 슬렌포니아로 향하게 된다.
안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 김초엽이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안나는 2차 혁명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 성공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2차 혁명 기술이 발견되자, 그녀의 기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녀는 결국 가족들마저 보지 못한 채로 자신의 '딥프리징' 기술에 의해 얼었다 녹았다 하며 지구에서 기약 없는 생을 보냈다. 김초엽은 이러한 '안나'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주목받음과 함께 그 반대에 있는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어떤 한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만든다.
과거에는 반짝였으나 이제는 홀로 가족들을 기다리는 안나와 2차 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김초엽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안나는 존재한다. 요즘 대부분의 식당에 들어서면 직접 주문하는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하곤 한다. 우리는 익숙하다는 듯이 사용하지만,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이나 온라인 매체들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의 안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안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서로 다른 안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이들은 소외와 배제,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발전이 이어지겠지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가 극복되기 전까지 안나는 다른 시대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수는 증가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김초엽은 과학기술이 발전된 미래와 그 미래 속에서 소외된 안나를 그림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먼저 우리 인식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가 답해 볼 차례이다. 김초엽의 SF는 과연 단순한 미래 세계와 발전된 과학기술을 그리는 소설일까? 나는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김초엽의 SF는 과학적 신선함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엿볼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고 있다. 과학이 발전된 미래 속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결국 작가 김초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반짝반짝한 미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소외된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